이태원 참사 속 영웅, 출동 소방관들이 남긴 진심과 책임

2022년 이태원 참사, 그날 출동했던 소방관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그날, 최전선에서 구조와 심폐소생을 수행한 주인공들은 바로 ‘소방관’이었습니다.
참사 당시 출동했던 소방 인력들의 목소리가 최근 공개되며, 늦은 시간까지 현장을 지켰던 그들의 고통, 사명감,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심리적 후유증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의 이야기와 현재의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참사 발생 당시 소방 대응은 어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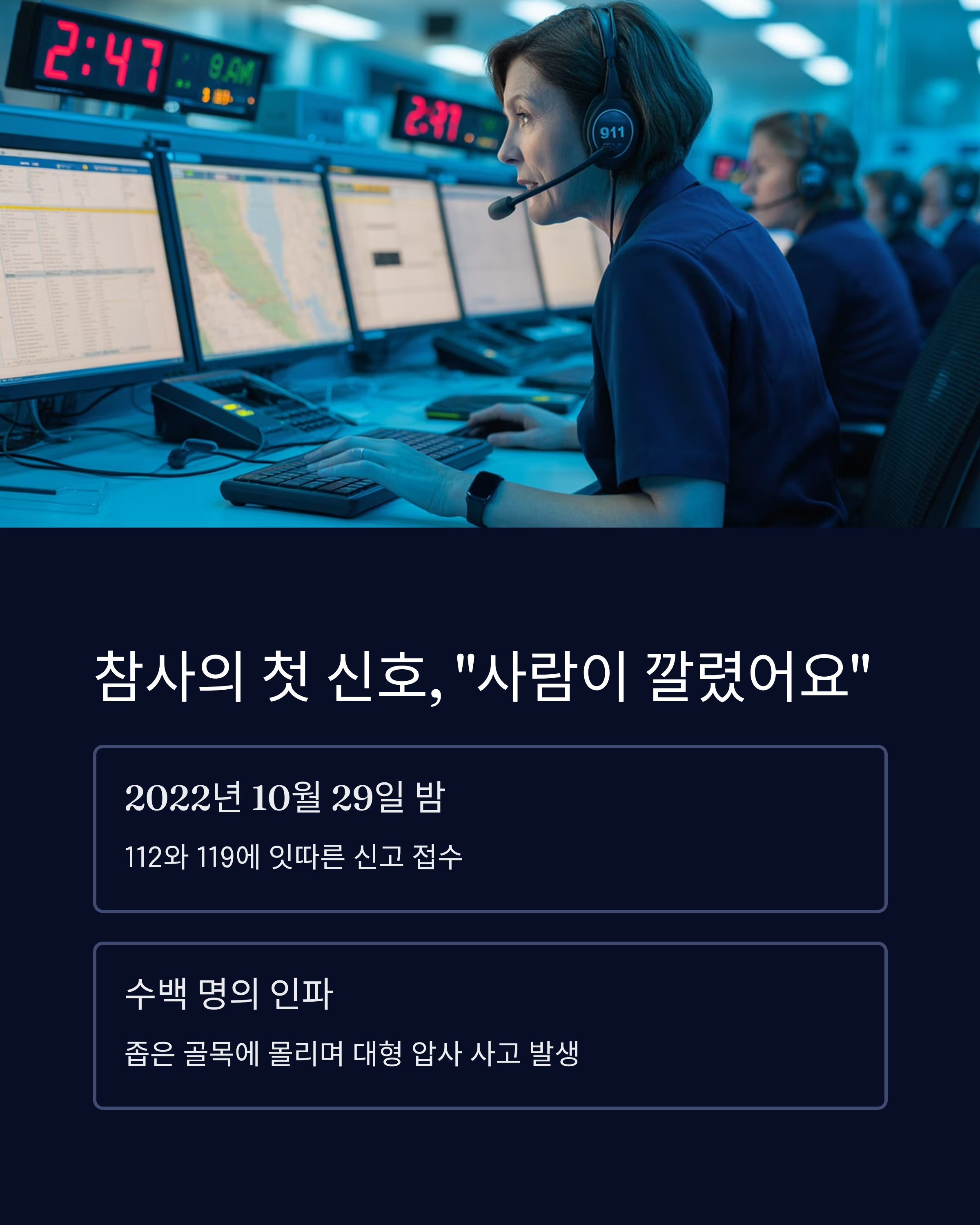
사고 접수는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 "사람이 깔렸어요"라는 신고로 시작됐습니다.
서울 종로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등 인근 소방대원들이 일제히 출동했고,
단 20분 만에 수십 대의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 진입해 생존자 분류, CPR,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1분 1초가 아까운 골든타임 속에서 인명을 구조했습니다.
이태원 현장, 그날 소방관들이 본 풍경

소방관들의 회고에 따르면, 도착 당시 이태원 골목은
“몸이 뜨지 못할 정도로 빽빽한 인파와 혼란”으로 가득했고,
정신없이 쓰러진 사람들 속에서 누구를 먼저 살려야 할지 판단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몇 명의 대원은 "구조가 아니라 분류였다"라고 할 만큼
그날의 참혹함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았다고 말합니다.
구조 활동의 한계와 현실

최선을 다한 구조 활동이었지만, 현장에는
중장비도 진입할 수 없을 정도의 좁은 골목,
연락체계 부재, 유관기관 간 지휘 혼선 등 복합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구조는 더디게 진행됐고, 구조를 위해 한 대원이
4~5명을 연이어 심폐소생술하다가 쓰러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소방관들은 아직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라는 자책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소방관들의 정신적 후유증

이태원 참사 이후 출동했던 소방관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면증,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몇몇 대원은 "그날 이후 현장 출동이 두려워졌다"라고 밝혔으며,
치료를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항목 경험 비율 주요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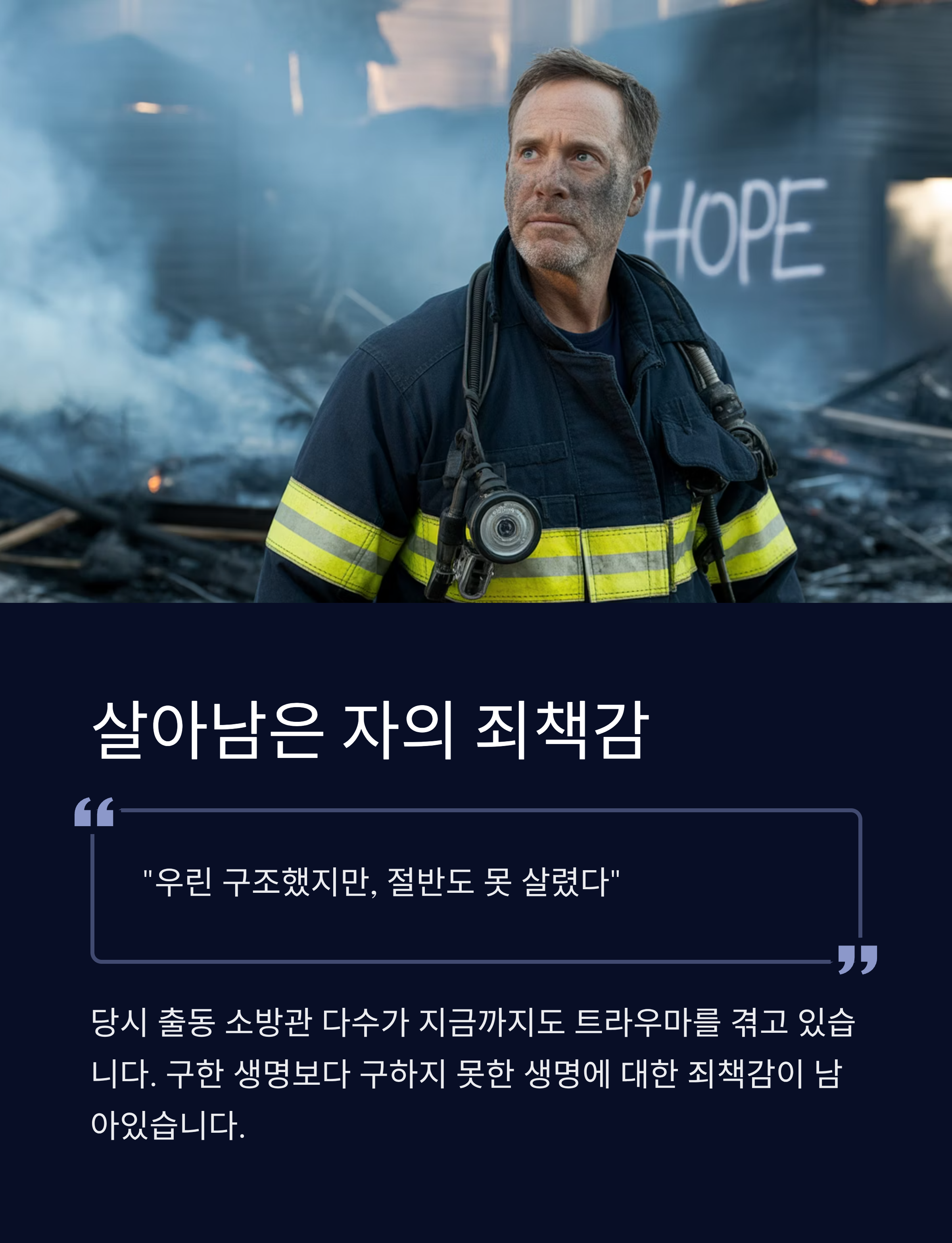
| PTSD | 약 40% 이상 | 악몽, 불면, 기억 회피 |
| 불안장애 | 약 30% | 현장 트라우마 재현 공포 |
| 집중력 저하 | 다수 | 일상 생활 중 업무 집중 어려움 |
이태원출동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

정부는 참사 이후, 현장 출동자들을 위한 심리지원팀을 구성했고
치유 프로그램, 상담치료, 순직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일선 대원들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영웅 취급이 아니라,
정기적 치료와 안전한 현장 시스템 구축”이라는 겁니다.
현장 경험자들의 목소리

한 대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CPR을 수십 번 했지만, 그중 절반도 살릴 수 없었다.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남는다.”
또 다른 소방관은 "우리는 그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담담히 말했지만,
그 말속에는 벅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록은 누구보다 그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기억해야 할 것

이태원 참사는 단지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그날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처럼 뛰었던 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소방관들의 희생과 감정 노동을 기억하고,
그들이 다시는 그런 현장에 고립되지 않도록
제도와 인식이 함께 뒷받침돼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제 필요한 건 추모를 넘어 ‘시스템’입니다.
재난 대응 매뉴얼, 현장 소통 체계, 장비 접근성까지
현실에 맞는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 남겨진 이들의 상처를
책임 있게 보듬는 사회의 성숙한 시선이 필요합니다.